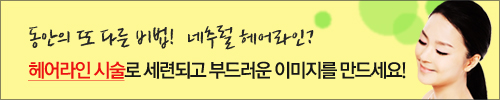2013년 9월 강릉 나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밤열차 이후 십여년 만에 밤기차를 타봤다. 늦은밤에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느낌은 잔잔한 흥분이다. 기차를 타고 밤새 어둠 속을 내쳐 달려 만난 동해바다는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한다.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뭍같이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어둑한 하늘아래 포말로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듣자니 유치환의 시가 생각난다. 반복이 많아 기억하고 있는 몇 안되는 시가 파도를 보는 마음을 더 채워주는 듯하다.
정동진 도착 새벽 4시 30분, 해가 뜨려면 기다려야 한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를 되뇌이며 역사로 들어갔다.
역사도 없고 플랫폼만 덩그러니 있었던 정동진은 없고, 역사 밖에선 그 이른 시간에도 숙소와 택시의 호객행위가 진행 중이다.
역사 안, 뜬금없어 보이는 피노키오 목각인형이 천정에 매달려 있다. 모래시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렴 어떠리,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리. 동행인들과 도란도란 수다와 함께 챙겨온 간식거리를 먹으며 일출을 기다린다.
여섯시,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럴수가!! 일출을 못보는가 싶어 아쉬움이 밀려 오려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비는 오는 금새 물러간다. 의유당이었던가, 동명일기? 행여 일출을 못 볼까 노심초사하여 새도록 자지 못하고 가끔 영재를 불러 사공다려 물으라 하니....
비는 그쳤지만 일기가 썩 좋지 못한 와중에도 동이 터오는 하늘은 오묘하다. 맨눈으로 보는 자연의 색은 카메라 설정을 아무리 만져봐도 고스란히 담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진 고수라도 조물주의 영묘한 작품을 인간의 미미한 기술로 담아내겠다는 인간의 마음이 애초부터 오만한 것일터.
해가 떠오르면서 존재감이 미미해지는 가로등에게 밤새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내며 사방 하늘을 둘러보니 매혹 그 자체다. 속도감 있게 바다 위에 펼쳐져 있는 구름이 일상의 시름도 덮어버린다.
여인들이 시집 한 권들고 분위기 잡던 그 해변의 여백이 많던 기차역은 여러가지 것들로 채워져 있다. 시선 저 끝에서 끊어진 철로와 나란히 서 있는 바람개비들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 정동진에 작별을 고하고 발길을 돌린다, 이날 본 하늘의 신비한 기운이 한동안 일상을 채워주길 바라면서.
그 날 새벽 미명의 동해 바다를 추억한다.
'시선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교장 京橋莊 Gyeongyojang (0) | 2013.10.27 |
|---|---|
| 강릉 안목, 선교장 (0) | 2013.10.04 |
| 파주 벽초지문화수목원 (0) | 2013.09.02 |
| 한 밤의 서울 버스 탑승기 (0) | 2013.08.27 |
| 닮음꼴? (0) | 2013.05.22 |